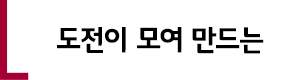사회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폭력, 그 실태와 해결책은?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는 2018년 1만203건에서 2023년 1만3939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특히 거절로 인한 보복성 폭력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는 2018년 1만203건에서 2023년 1만3939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특히 거절로 인한 보복성 폭력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호주 멜버른 대학 로스쿨의 헤더 더글러스 교수는 이러한 폭력의 근본 원인을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찾는다. 그는 가해 남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폭력의 주요 동기가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호주의 '강압적 통제' 개념 도입이다. 2025년부터 퀸즐랜드주에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최대 14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서 일상적 통제, 고립, 모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더글러스 교수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비치명적 목졸림(NFS)'의 위험성이다. 이는 즉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신경 손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폭력 형태다.
호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들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야 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이뤄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와 페미니즘 의식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확고한 법적 체계 확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테러 대응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의 기본 책무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오직 왕(王)들만 먹었다는 천하제일 명약 "침향" 싹쓰리 완판!! 왜 난리났나 봤더니..경악!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